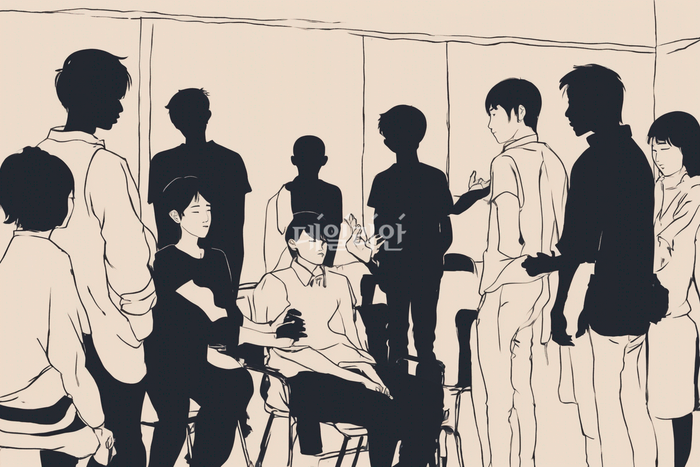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곁에는 함께 걸어주는 공간이 있다. ‘함께한걸음센터’는 중독자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국 단위 회복 지원망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서울, 부산, 대전 등 3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곳이 추가돼 현재 17개소로 확대됐다.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울산, 충북, 경북, 대구, 광주, 서울, 제주, 경남, 전남, 전북 등 전국을 망라한다.
센터는 상담, 교육, 재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전화·온라인·내원을 통해 중독 위험군을 선별하고 단기 개입이나 외부 기관 연계를 결정한다.
이후 대면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어진다. 조건부 기소유예자나 수강·이수명령을 받은 마약사범에게는 의무적 재활 교육도 제공된다.
재활 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심리검사를 통해 나타난 불안·우울·자존감 저하를 다루는 상담, 단약 동기가 낮은 이용자에게 동기를 높이는 중독 상담이 진행된다. 청소년과 성인으로 나눠진 연령별 프로그램, 여성 대상 집단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 있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단약 유지 의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과도 구체적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초기 상담, 재활교육, 사례관리 등 사회재활 서비스는 총 2만3908건이 제공됐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만9283건에 달했다.
단기간에 높은 이용 실적이 쌓이면서 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이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복 이후 자원봉사자로 돌아와 다른 이용자들을 돕는 사례도 늘고 있다. ‘회복의 선순환’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센터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식약처와 마퇴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센터를 8개 권역으로 나눈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가 운영된다.
검찰, 보호관찰소, 지방자치단체, 병원, 법무보호복지공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다. 특히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통해 마약 사범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해 단약 유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한다.
사법기관과의 연계는 중요한 축이다. 검찰은 중독 평가를 의뢰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법무부는 보호관찰과 치료·재활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이렇게 범정부적 협력 체계가 구축돼, 센터는 단순한 상담소를 넘어 국가적 사회재활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 운영에는 예방의 의미도 있다. 숨어 있는 중독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청소년 복지시설, 소년원, 교정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재활 상담도 이뤄진다. 중독으로 내몰리기 전 개입해 회복의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센터를 거점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활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사회적 파급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회복을 돕는 손길이 넓어질수록 마약 문제는 개인의 고립이 아닌 사회적 회복의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