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수동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회의, 미팅, 행사, 팝업 등 대부분 일 때문이라 개인적 산책은 늘 ‘언젠가’로 미뤄두다 몇 시즌, 한 해가 훌쩍 지나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카페에서 반나절을 붙박이로 보내며 처음으로 연무장길 거리를 오래 바라본 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외국인의 비중, 그리고 그 다양성이었습니다. 유럽‧미국‧동남아‧중동이 뒤섞인 국적, 유모차를 미는 부모부터 20대 여행자, 중년 커플까지 연령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교차로마다 공항 출국장의 한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성수는 어느새 ‘서울의 힙’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필자 촬영
ⓒ필자 촬영
업계에서 성수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신제품 론칭의 정석처럼 팝업을 열지만 임대료와 시공비는 매 계절 신기록을 세웁니다. 안 하면 “왜 안 했지?”라는 질문을, 하면 “이 비용을 어디서 회수하지?”라는 숙제를 떠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철거-시공-오픈-철거가 반복되며 생기는 폐기물과 잔업, 모두가 예술가인 척하는 과잉의 연출, 막 태어난 브랜드의 서사가 과하게 장중할 때 찾아오는 피로감도 있습니다. “다윈이 2025년에 살았다면 진화론 연구를 위해 성수동에 살아야 했을 거야.” 이 기묘한 생태계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더 빠르고 더 특이해집니다. 종종 그 치열하고 ‘트렌디’한 하루의 끝은 묘한 허무함이 남고요.
하지만 해외 시선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성수는 ‘압축된 3D 트렌드북’입니다. 한 블록 안에서 전 세계 전시·리테일 포맷이 순환하고 매번 다른 세계관이 실험됩니다. 파리에서 최소 두 시즌은 지속될 무대가 성수에선 2주 만에 다른 실험으로 갈아탑니다. 이 회전율과 속도, 공간을 통해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드는 디테일은 바이어와 에디터에게 현장 수업 같은 자극을 줍니다. 그들은 하루 이틀 ‘실물 트렌드 스캔’을 하고, 눈에 들어온 로컬 브랜드에는 현장에서 콜라보를 제안하기도 하죠. 쇼윈도, 그래픽, 동선, 음악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자기 도시의 매장에 이식합니다. 우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밀라노 매장에서 VMD 스케치를 몰래 따오곤 했는데, 격세지감이 듭니다.
해외가 이야기하는 성수의 매력은 장르의 혼합에서도 드러납니다. 카페 안에서 신제품 드롭과 아트워크 전시가 동시에 열리고, 밤이면 디제이 셋이 공간의 호흡을 바꿉니다. 낡은 공장은 쇼룸으로, 주차장은 마켓으로, 비좁은 복도는 퍼포먼스 통로로 변신하죠. 패션‧라이프스타일‧아트‧푸드가 자연스럽게 뒤얽히며 ‘공간 브랜딩’의 내일을 미리 시현합니다. 그러니 해외 크리에이터들은 성수를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때로는 ‘슬쩍 훔치는’ 실험실로 기억할 수밖에요. 업계 종사자와 크리에이터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캐나다·호주·독일·말레이시아에서 온 20대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말하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곳은 없어요. 끝내주게 멋있고, 빠르고, 모든 게 세련됐어요.” 맞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이 드라마틱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고 내부자의 피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숫자는 냉정하고 현장은 고단합니다. 공실은 좀처럼 보기 어렵고 권리금은 동네의 전설처럼 회자되죠. 과잉의 진동.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우리는 압니다. 이 과잉이야말로 오늘의 성수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산업을 일구고 있다는 것을. 이 과잉에 더 열광하는 해외 관광객의 유입과 다양성, 여기에 산업이 더해져 성수는 뜨고 지는 서울의 여느 동네와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수동에 주로 일 때문에 가겠지만, 아주 가끔은 그 긴 회의 대신 거리를 걸어 ‘이번 주 성수’를 체온으로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테마파크에 가듯 팝업 계정 몇 개를 팔로우해 시간표를 짜 보고, 관광객의 얼굴로 그 동선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인파에 떠밀리기도 하고, 긴 줄을 서 보기도 하고, 인생네컷도 찍으면서요. 타자의 시선을 빌려 보고‧듣고‧맛보고‧즐기는 공간으로 초점을 돌리는 순간, 너무 가까이 살아서 미처 몰랐던 바로 지금 성수의 매력을 즐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만들어낸 성수동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지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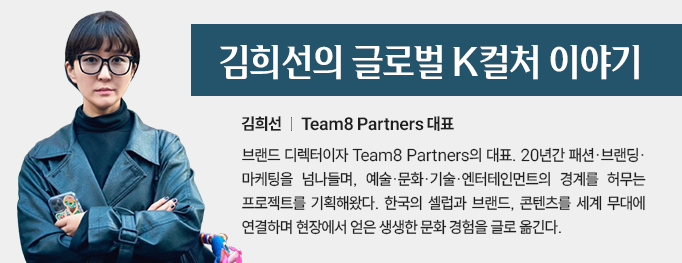 ⓒ
ⓒ
김희선 Team8 Partners 대표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