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샤헤드-136 자폭 드론 기술이 러시아 거쳐 북한까지 전달
이란~러시아~북한으로 이어지는 드론 커넥션 완성 조짐
게란-2 드론을 통한 북한의 대남 공격 위험 점증
 북한과 이란 국기.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북한과 이란 국기.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이란과 북한의 군사협력이다. 이란과 북한은 1980년대부터 탄도미사일과 핵 분야에서 폭넓게 협력해 왔다. 그리고 이제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드론(UAV·무인항공기) 분야에서 러시아를 매개로 이란과 북한의 드론 커넥션이 구성됐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도 쩔쩔매게 했던 이란의 드론 무기가 북한으로 넘어가 한국을 겨냥한다는 말이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8월 1일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自爆) 드론 기술을 평양에 이전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해 미사일 개발을 교류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발언으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은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란이 자랑하는 샤헤드-136은 자폭형 드론으로 비행시간은 미국제나 중국제에 비해 짧지만, 시속 185km 정도에 2500km 정도의 거리까지 날 수 있다고 한다. 샤헤드라는 단어에 증인 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으니, 자폭 드론이란 컨셉과 잘 맞다. 미국의 MQ-9 리퍼나 중국의 윙룽-3 같은 첨단 드론보다는 저렴하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무게 200kg에 50kg의 탄두를 탑재하여 정밀 타격보다는 벌떼 공격과 물량 공세에 적합하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다.
그동안 샤헤드-136을 납품받은 러시아는 중국과 러시아산 부품을 섞어 게란(Geran)-2라는 이름으로 개량한 뒤,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 옐라부가 드론 공장에서 매월 5000대 이상을 생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다 집요하게 퍼부었다. 지난 6월 한 달만 해도 2736대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2만 달러 짜리 드론을 요격하려고 수 백만 달러의 지대공(地對空)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비행 모습. ⓒ 연합뉴스
이란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의 비행 모습. ⓒ 연합뉴스
이란은 최근 이스라엘과 12일 전쟁(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을 치르면서 드론 부대의 실전 감각이 뛰어나고, 졸병인 하마스·헤즈볼라·후티 반군 등을 통해 드론 공격을 원격 지휘한 경험까지 있어 드론이라면 '최고 권위'라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샤헤드-136의 기술과 노하우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난 7월 초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북한이 샤헤드-136의 러시아 버전인 게란-2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러시아 교관들이 북한 평양과 원산 인근 훈련장에서 북한 드론 조종사들에게 '1인칭 시점(FPV) 드론'을 비롯한 공격용 드론 조종법을 훈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북한이 생산할 게란-2 드론은 시속 500km까지 가능한 제트 추진 개량형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레이더에는 새처럼 보이기 때문에 탐지하거나 요격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구성시 소재 방현비행장 등에 드론 생산·시험 비행 시설을 마련하는 등 부쩍 드론 무기화 작업을 앞당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가로 북한에 드론 생산설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2023년 김정은의 지시로 드론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해 왔는데, 만일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수 천대의 군사용 드론을 도입할 경우 남한 어디든 구석구석 알뜰하게 맹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란의 무기기술이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국제적 안보 위협이다.
신정체제(神政體制)를 지향하는 이란과 전체주의(全體主義)·전제주의(專制主義)·우상숭배(偶像崇拜)가 결합된 북한은 오랜 친구다. 이란은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과 급속히 가까워졌다. 당시 이란 편을 든 나라가 많지 않았는데 북한이 적극 도와주었다. 전투력이 떨어지는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은 상당수 인력과 함께 소련제 T-54와 T-55 전차, 탄약, 중국제 장비를 넘겨주었다. 이란은 전쟁 초반 이라크의 미사일 공세에 무방비로 당했기에 미사일이라고 하면 이가 갈렸다. 그래서 북한은 이란·이라크전쟁 말기와 1990년대 초에 소련제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 200~300기(基)를 이란에 수출했고, 이란은 이름을 각각 샤하브-1과 샤하브-2로 바꿨다.
이란은 또 북한이 스커드보다 덩치를 25% 정도 키운 중거리 노동 미사일을 제공받아 샤하브-3라고 명명했다. 이란은 최대 사거리가 1000㎞ 미만인 샤하브-3를 개조하여 사거리 2000㎞에 육박하는 가드르(Ghadr) 미사일을 만들었고, 2004년에 처음 시험 비행했다. 2011년 5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과 이란항공은 정기적으로 미사일 관련 장비를 옮겼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협력한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란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키웠다.
 이란의 샤헤드-136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게란-2 자폭 드론들. ⓒ CNN
이란의 샤헤드-136 기술을 바탕으로 러시아 공장에서 대량생산되고 있는 게란-2 자폭 드론들. ⓒ CNN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양측이 협력했다는 의혹도 확대되었다. 2002년 이란의 나탄즈·아라크 핵시설을 폭로한 반체제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는 “2015년 북한 핵 과학자들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2월 강행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두고 외신에서는 ‘이란·북한 합작무기 테스트’라고 평가했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교류는 미사일에 비해 관련 증거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2021년 6월 20일 김정은은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면서 ‘강력한 이란 구축(building a powerful Iran)’이란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이란을 응원했다. 미사일과 핵으로 다져진 이란과 북한의 우의는 향후 드론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더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물론 한국군도 드론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위상을 더욱 높이고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등 숱한 과제들이 많다. 드론이란 새로운 무기에 대한 시프트(Shift)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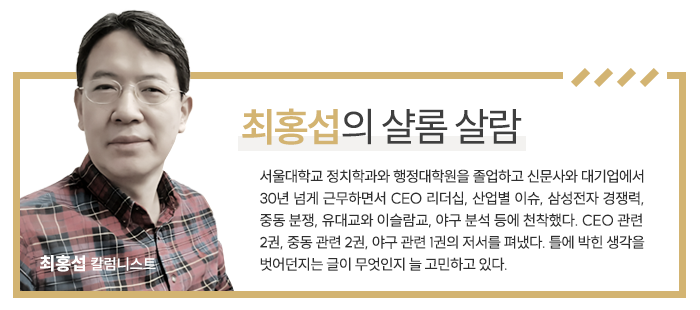 ⓒ
ⓒ
글/ 최홍섭 칼럼리스트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