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스코, 특발성 폐섬유증 후보물질 임상 1상 IND 제출
모회사 오스코텍과 복제 상장 논란에 지난 4월 IPO 무산
단독 개발 파이프라인, 중복 수익 이슈 해결 가능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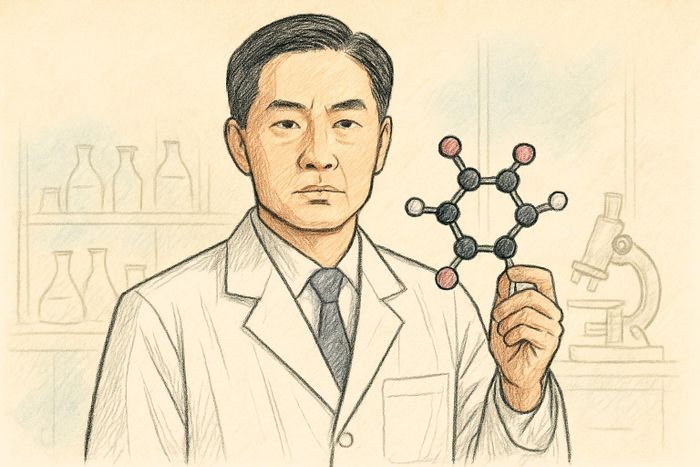 신약 개발 관련 이미지. AI 이미지
신약 개발 관련 이미지. AI 이미지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을 개발한 제노스코가 독자 신약 개발 소식을 알렸다. 모회사 오스코텍과의 중복 상장 논란으로 코스닥 IPO 계획이 좌초된 이후 회사가 독자적인 기업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제노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물질 ‘GNS-3545’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 이번 임상은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초기 연구로, IND 승인이 이뤄지면 제노스코는 올해 안에 임상 1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GNS-3545는 제노스코가 독자적인 R&D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발굴한 핵심 파이프라인이다. 제노스코가 개발하고 있는 후보물질 중 가장 진전이 빨라 렉라자 이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 받는다.
2000년 설립된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는 올해 초 코스닥 입성을 추진했지만, 지난 4월 한국거래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노스코의 상장을 중복 상장을 넘어선 ‘복제 상장’으로 규정하며 최종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의 지배, 수익 구조였다. 제노스코 최대 주주는 지분 59.12%를 보유한 오스코텍이다. 이외에 메리츠증권이 약 20%, 김정근 전 오스코텍 대표의 아들 김성연씨가 약 13%, 유한양행이 약 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익 구조는 보다 단순하다. 얀센이 지급하는 로열티의 60%는 유한양행이, 40%는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각각 절반씩 나눠 갖는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두 회사의 매출이 중복되고 기업의 실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회사가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재상장하는 일반적인 ‘쪼개기 상장’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업과 수익이 얽혀있다는 점이 상장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당시 오스코텍 주주들 또한 자회사 상장으로 기업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고 판단, 제노스코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로열티 수익은 제노스코의 매출원이자 연구개발의 기반이 됐지만 동시에 상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단일 수익 모델 만으로는 제노스코의 독립적인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웠고 이는 결국 거래소 상장 미승인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제노스코에게는 렉라자를 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현재 제노스코의 매출은 전적으로 렉라자 로열티에 의존하고 있다. 렉라자 로열티 외 뚜렷한 매출원이 부재한 제노스코는 올해 상반기 매출 54억원, 영업손실 60억원을 기록했다. 로열티 수익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R&D 비용이 대규모로 투입된 결과다.
이번 GNS-3545 미국 임상 1상 IND 제출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노스코가 던진 ‘승부수’로 해석된다. GNS-3545는 제노스코가 100% 단독으로 권리를 소유하고 개발을 주도하는 첫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에서 상장 실패의 원인이었던 중복 수익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평가를 받는다.
GNS-3545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제노스코는 오스코텍과 분리된 독자적인 R&D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 렉라자 로열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고질적인 수익 공유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GNS-3545의 성공 여부가 향후 제노스코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해 독자적인 기업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다면 과거의 실패를 딛고 재상장을 추진할 명분을 얻게 된다. 모회사인 오스코텍과의 흡수합병 시나리오로 이어지더라도 오스코텍 전체의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노스코 관계자는 “모회사 오스코텍과 공동개발한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기술이전 후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신약 허가 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노스코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