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는 동양란 화분 네 개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름에 한 번쯤 물을 주는 것이 고작이지만, 그마저도 잊고 지나칠 때가 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꽃을 피워 잔잔한 미소를 건넨다. 환한 얼굴로 위로를 건네다가도 지고 나면 말라버린 꽃대를 남기고 다시 일 년을 기다린다. 평범한 화분일 뿐인데, 세월 속에 스며들어 삶을 지탱하는 벗이 되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네 개의 난 화분
집에서 기르고 있는 네 개의 난 화분
올여름, 한 화분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봉오리를 기다리며 가슴 설레었지만, 불볕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꽃이 피기도 전에 고개를 떨구었다. 활짝 핀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기를 기대했는데 검게 그을린 꽃대라니. 아쉬움에 가슴이 아릿하다. 따가운 햇볕을 헤아리지 못하고 베란다에 둔 무심한 탓이리라. 반그늘이 진 안쪽으로 옮기자 한 달 남짓 지나서 다른 두 화분에서 새로운 꽃대가 차례로 솟아올랐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이 움트듯, 시든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난 것이 아니겠는가. 꺾인 듯 보였던 자리에서 새 꽃대가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삶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꽃대를 올리다 시들어 버린 난
꽃대를 올리다 시들어 버린 난
난은 까다로운 식물이다. 물을 지나치게 주면 뿌리가 썩고, 소홀히 하면 잎이 마른다. 볕을 쬐어야 꽃을 맺지만, 햇볕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 버린다. 그늘에만 두면 꽃을 피우지 않는다. 다습과 건조, 햇볕과 그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향기를 드러낸다. 이러한 습생도 모른 채 팽개치듯 두었으니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으랴. 그 앞에서 삶의 이치를 배운다. 넘치면 흘러내리고, 모자라면 메마른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 또한 난처럼 균형의 자리에 서야 꽃을 피울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공자가 논어에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라는 것은 어쩌면 난을 두고 한 말이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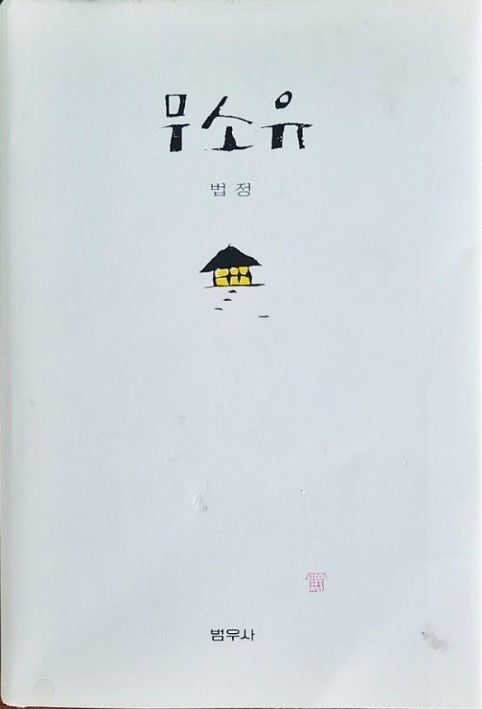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자 표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자 표지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글이 떠올랐다. 스님은 지인에게서 난 한 분을 선물 받아 길렀다. 처음엔 향기와 자태가 고와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비료를 구해주며 정성을 쏟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짐으로 느껴졌다. 물을 제때 주어야 하고, 햇볕을 쬐게 하려면 창문을 열어두어야 했다. 봉선사에 다니러 간 어느 날 한낮에 뜰에 내놓은 난 잎이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허둥지둥 돌아왔다. 홀가분하게 유유히 떠나고 싶어도 화분 하나에 마음이 묶이니 발걸음이 자유롭지 못했다. 난은 어느새 스님을 얽매는 족쇄가 된 것이다.
 창가에 놓인 난 화분
창가에 놓인 난 화분
며칠 뒤 벗이 찾아와 돌아갈 때, 선뜻 화분을 내어주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날아갈 듯 홀가분했다고 술회한다. 스님은 난을 통해 무소유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 아름다움조차 소유의 굴레가 될 수 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주었다. 우리 집 난 화분을 떠올린다. 은은한 꽃을 피울 때는 기쁘지만, 지고 나면 무심해지는 나의 태도 또한 소유의 또 다른 얼굴은 아닐까. 우리는 종종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해 자신을 옭아매곤 한다. 법정 스님은 난 앞에서 버림의 지혜를 배웠고, 나는 무심한 듯 난을 곁에 두고, 그저 피고 지는 시간을 지켜볼 뿐이다.
 다소곳이 외로이 핀 난
다소곳이 외로이 핀 난
난이 주는 가르침은 비움에만 머물지 않는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난을 길렀다. 깊은 외로움과 세속과의 단절 속에서도 난은 벗이자 스승이었다. 시문집인 '여유당전서'에서 "난은 그윽하되 요란하지 않고, 향기는 은은하되 멀리 퍼진다."라고 했다. 은둔한 군자라 할지라도 덕은 세상에 스며든다는 뜻이리라. 난의 습성이 곧게 서서 바람과 이슬을 견디는 모습이듯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조와 품격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 거쳐 했던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 거쳐 했던 다산초당
선생은 험난한 시대에 18년 동안 유배지에 묶여 있었지만, 학문을 놓지 않았다. 난 앞에서 '비록 몸은 이곳에 갇혀 있어도 배운 도리와 예의는 저버리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목민심서와 경세유포, 흠흠신서 등 오백여 권의 책을 편찬하는 등 학문을 집대성하였다. 가녀린 줄기와 은은한 향은 꺾이지 않는 학자의 기개와 닮아 있었다. 다산에게 난은 희망이자 절개의 표징이며, 끝내 지켜야 할 가치였다. 법정 스님이 난에서 ‘비움’을 배웠다면, 다산은 ‘정절’을 닮은 것이리라. 하나는 버림으로 자유를 얻었고, 다른 하나는 붙듦으로 존재의 뜻을 지켰다. 서로 다른 길 같으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개의 진실이다. 버릴 때 비로소 얻을 수 있고, 붙잡아야 할 것은 끝내 지켜야 한다.
 활짝 핀 난
활짝 핀 난
오늘도 난을 바라본다. 꽃대를 올리다가 시들기도 하고, 새로운 봉오리를 밀어 올리기도 한다. 스러짐과 돋아남을 거듭하는 난을 보고 있노라면 인생 또한 꺾임 속에서도 새 힘을 길러낼 수 있다는 용기를 일깨워주는 것이 아닐까. 말 없는 난 앞에 서면 두 스승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오는 듯하다. “소유에 매이지 말라”,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은 마치 은은한 향기처럼 번져 내 삶을 일깨운다.
 ⓒ
ⓒ
조남대 작가 ndcho55@naver.com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