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 인터뷰
“희귀·난치 질환…제도권 안으로 품어주는 유연성 필요”
“후학이 없는 현실…전문 인력 붕괴 심각”
환자를 향한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환자 치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분을 제보해주시면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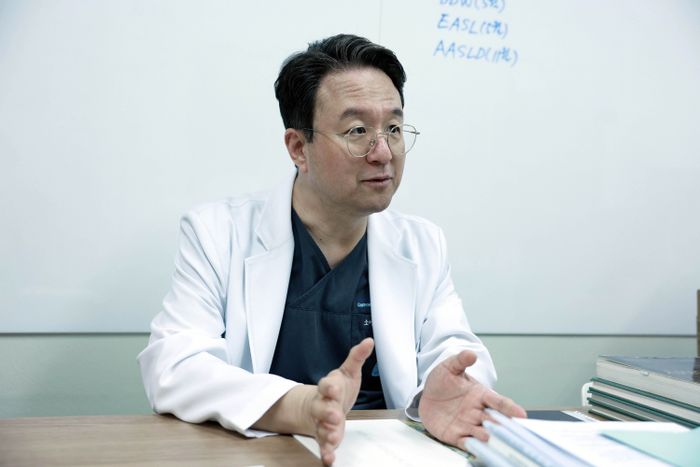 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가 1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가 1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해외에 약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당장 쓸 수 없을 때, 그 무력감이 가장 큽니다.”
밤새 가려움에 울며 잠들지 못하는 아이, 치료제가 있어도 ‘당장’ 투여하지 못해 병원과 집을 오가며 버티는 부모,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붙잡아주던 전문의가 한 명씩 사라지는 진료실.
소아 희귀질환을 진료하는 현장은 지금, 치료제 공백과 인력 부족이 동시에 밀려오는 위기 한 가운데 서있다. 지난 12일 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를 만나 현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들어봤다.
“치료제 공백, 의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희귀 질환 치료 현장에서 가장 큰 난관은 ‘치료제 접근성’이다. 해외에서 이미 표준 치료로 사용되는 약을 국내에서는 즉시 투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1~2개월의 배송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반복된다.
고 교수는 “가장 힘든 순간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약을 한국에서는 당장 쓸 수 없을 때”라며 “아이의 병이 빠르게 나빠지는 걸 보면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제약기업 ‘입센’의 간질환 치료제 ‘빌베이’ 도입 과정에 참여하면서 제도적 한계를 다시 실감했다. 절차 단축을 목표로 한 시범사업이었지만 실제 도입까지 2년 넘게 걸렸고, 그 사이 환아의 간 손상은 진행됐다. 고 교수는 “진단한 날 바로 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아이의 삶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약을 들여올 수는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사실상 활용이 어렵다. 그는 “고가 약품 폐기를 우려해 국가 차원의 비축을 못 한다고 하지만, 한두 명 살리자고 하는 일에 우리가 그 정도도 감당 못 할 나라는 아니다”며 “버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축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가 1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소화기영양과 교수가 12일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희귀질환 아이를 둔 가정은 의료비보다 ‘시간과 노동’의 부담이 훨씬 크다. 산소통을 달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오기 위해 부모와 조부모까지 총동원되는 일이 흔하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고 교수는 특히 형제·자매가 겪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부담을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너는 괜찮니?’라고 정말 묻고 싶을 때가 있다”면서도 “답이 너무 뻔해 차마 물을 수가 없다”라고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기 진단 체계의 취약함도 문제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만이라도 희귀질환을 전담할 소아 전문의를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인력난이 심각하다. 유전자 검사는 1회만 급여가 적용돼 반복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부모의 부담이 한층 커진다.
병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아도 임상적으로 희귀질환으로 판단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제도상 희귀질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일도 발생한다.
고 교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 수 없는 병이지만 희귀 질환이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희귀·난치질환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때 제도권 안으로 품어줄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현장을 울리는 ‘말’
힘든 현실 속에서도 고 교수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를 붙잡아두는 것은 치료 끝에 다시 건강을 되찾은 아이와 부모가 건네는 짧은 한마디다. 그는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다”면서 “그 한마디가 상황을 견딜 힘을 준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그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줄 의사를 지키는 일”을 꼽았다. 치료제 접근성이나 조기진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 인력의 붕괴’라는 것이다.
그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기껏해야 10년 남짓이지만, 뒤를 이을 인력은 사실상 비어 있다고 털어놨다. 고 교수는 “예전에는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며 이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돌아서는 경우가 늘었다”며 “환자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구조 때문이다 보니 젊은 의사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학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면서 “희귀 난치질환을 공부하고 진료하고 환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의사들이 계속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