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1918년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을 때 독일 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패전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그들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지지 않았다. 다만, 뒤에서 누군가가 비수를 꽂았을 뿐이다.”
이른바 ‘배후중상설(Dolchstoßlegende)’이다.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은 패배의 책임을 내부의 특정 집단에게 돌리며 국민의 분노를 외부가 아닌 ‘안쪽’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외부 요인 탓하기’ 전략은 결국 독일 사회를 병들게 했고 극단적 포퓰리즘의 등장을 부추겼다.
이 오래된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 골프장 업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특정 권역의 골프장들이 비교적 낮은 그린피를 책정하면서 인근 권역 골프장의 내장객이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웃지역 골프장들의 ‘저가 정책’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일견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그 속에 깔린 정서는 익숙하다. 바로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는 오래된 자기기만의 그림자다. 과연 정말 저가정책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고객의 선택은 늘 최종 심판이다. 소비자가 더 나은 가성비, 더 나은 경험, 더 나은 거리를 고려하여 다른 골프장을 선택했다면 이는 ‘배신’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이다. 소비자의 이탈을 타 지역 골프장들의 그린피 탓으로만 돌린다면 이는 곧 고객에게 “왜 당신은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골프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예전처럼 입지와 수요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골프장은 더 이상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산층의 일상적 여가이자 지역사회의 문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의 방식도 고객이 느끼는 ‘가치’의 기준도 달라졌다.
골프장 운영은 고정비가 높고 계절성이 강한 사업이다. 따라서 그린피 책정은 각 사업자의 경영전략에 따른 정당한 자유다. 특정지역이 상대적으로 토지 원가가 낮고 인건비나 유지비를 효율화하여 저가 책정이 가능하다면 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경영 혁신의 결과다.
반대로 다른 경쟁지역 골프장들이 “우리도 가격을 낮출 수 없어서 못 낮추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는 내부 비용 구조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피해’는 경쟁자 탓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 구조에서 비롯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뱅크
고객은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다. 골퍼들은 코스관리 상태, 캐디의 응대 태도, 클럽하우스의 분위기, 식사의 질, 모바일 예약의 편의성까지 모두 포함된 ‘총체적 경험’을 소비한다. 그 전체가 기대 이하일 때 고객은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빠르게 메운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누가 우리의 고객을 빼앗아 갔는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왜 고객이 우리를 떠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배후중상설’을 떠올려야 한다. 패배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내부 개혁의 동력은 사라진다. 경쟁자이자 상생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의 전략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순간 조직은 정체된다. 업계 전체가 그런 프레임에 빠지면 시장은 건전한 성장 대신 소모적 갈등으로 치닫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 탓이 아니라 성찰, 견제보다는 혁신이다. 어느 골프장이나 자부심을 지키고 싶다면 가격 인하 경쟁에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의 철학과 스타일을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길을 택해야 한다. 골프장은 시설이지만 더 넓게 보면 '경험을 파는 무대'다. 그리고 그 무대의 연출자는 다름 아닌 경영자 자신이다.
한때 서울 압구정동 상권이 무너졌을 때도 사람들은 “강남 외곽으로 손님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가게들은 외곽으로 간 손님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차이는 단지 가격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은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마찬가지다. 우리 골프장이 경쟁력을 되찾고 싶다면 타 골프장의 가격에 화살을 겨누기보다는 고객의 기억 속에 어떤 경험으로 남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의 ‘색’을 지킬 때, 비로소 시장 전체의 품격도 함께 높아진다.
다시 말하지만, 싸움은 바깥에서 지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분열로 오는 것이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창의적 경쟁이며 그 품격이야말로 미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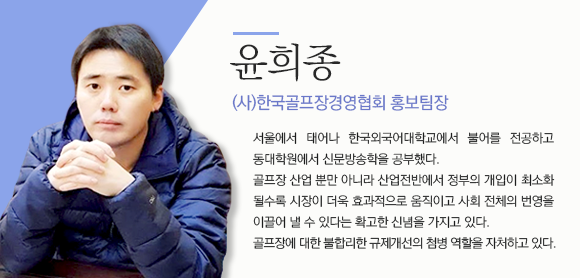 ⓒ
ⓒ
글 / 윤희종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