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액티브 ETF시장 주식형 비중 60%…국내는 9% 불과
"국내 액티브 ETF 성장세 이어질 것…규제환경 정비 필요"
"상품 출시 위한 심사등록 및 상장 심사 간소화 필요"
"추종지수와 상관계수 유지 의무 원칙적으로 폐지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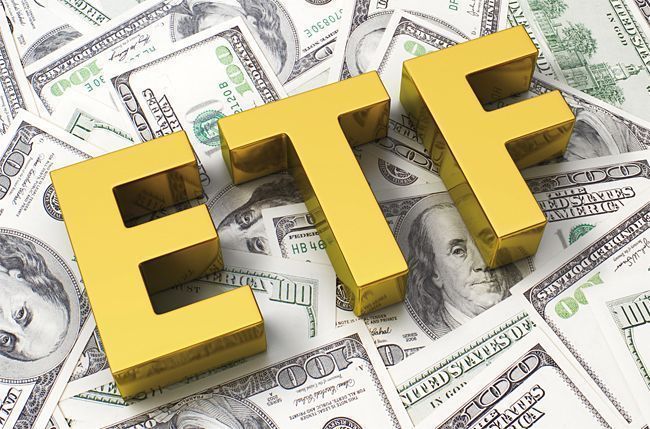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ETF 시장의 체질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과 개별 종목의 실적을 고려해 적극 운용하는 액티브 ETF 중에서도 주식형 상품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영향으로 성장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액티브 ETF의 부상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ETF 시장에선 지수 추종형 패시브 상품보다 액티브 상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말에서 올해 5월 말까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ETF 시장의 총운용자산(AUM) 규모가 154% 증가할 때, 액티브 ETF 시장은 773% 늘었다.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Benchmark Index·BM) 대비 초과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장 환경 분석 등을 거쳐 편입 종목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종목별 가중치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액티브 ETF시장에서 주식형 상품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2019년 말에는 AUM 기준 미국 액티브 ETF의 75.9%가 채권형이었고, 주식형 비중은 19.3%에 불과했다.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에서도 채권형(52.1%)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액티브 ETF 중 주식형 비중은 미국(62%), 미국 이외 국가(64%)에서 예외없이 과반을 기록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 ETF 시장에서도 액티브 ETF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액티브 ETF 순자산총액은 주식형이 출시되기 시작했던 2020년 말 2.1조원에서 지난 5월 말 70.9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국내 액티브 ETF의 자산유형은 글로벌 액티브 ETF시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에선 주식형 비중이 60%를 넘지만 국내의 경우 채권형, 채권혼합-파생형이 75.8%를 차지한다. 주식형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전체 주식형 ETF에서 액티브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에 그쳤다.
김 선임연구원은 "액티브 주식형 ETF는 일반 액티브 펀드를 대체하거나,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주력은 아니다"면서도 ▲패시브 주식형 ETF와의 경쟁 ▲액티브 운용의 장기 운용성과가 패시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적 우려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 비투명 ETF 불허 등과 같은 규제환경 등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 성장세가 더디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 유인체계, 국내외 자본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액티브 ETF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주식형의 미약한 시장규모 등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자산운용업의 노력 및 규제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ETF 상품 출시를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서 각각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심사 등록 및 상장 심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를 유지하고 자산 구성내역을 매일 공개해야 하는 규정도 손 볼 필요가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액티브 ETF는 특정 지수의 방향성을 추종하지 않는다"며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액티브 ETF에 대한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실시간 랭킹뉴스
실시간 랭킹뉴스
댓글 쓰기